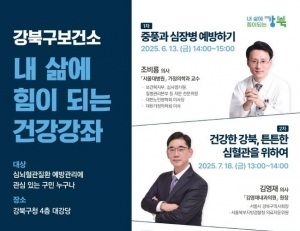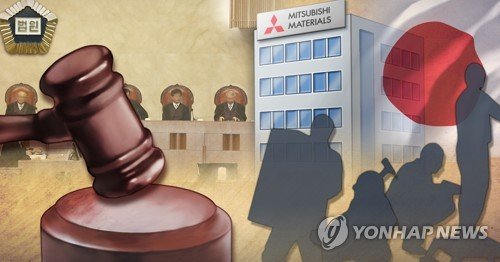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(PG)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(PG)(서울=연합뉴스) 황재하 정래원 기자 =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재판이 잇달아 공전했다.
서울고법 민사33부(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)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·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 소송 기록이 송달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.
재판부는 "일단 10월 20일까지 기다려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
이 사건은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 84명이 17곳의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간 제기된 같은 성격의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컸다.
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"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,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"며 원고들의 청구를 '각하'했고 이에 원고 중 일부가 항소했다.
이 같은 1심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낼 권리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됐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-2부(당우증 최정인 김창형 부장판사) 역시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.
이 사건은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이다.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.
정씨의 자녀들은 2019년 소송을 냈는데,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2012년 이후 3년 넘게 지나 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.
다만 다른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2012년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.
이날 진행된 두 사건 모두 피고 측이 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사건에 대응했으나 항소심 이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.
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'공시송달'을 한 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.